상세 컨텐츠
본문
처음 계획은 여수에서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을 가는 거였다. 거기는 한정식이지만 각종 생선회와 해산물 그리고 게장도 나오면서 엄청 푸짐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다. 하지만 속이 골골한 나는 산해진미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나의 사정을 고려하여 함께 간 사람은 그냥 속을 달래 줄 진한 국물이나 먹으러 가자며 앞장을 섰다.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여수에서의 사골 국물 집을 가게 되었다.



얼추 어디를 가든 관공서 부근에 맛집이 있기 마련이다. 여수 시청 근처에 분명 괜찮은 맛집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무작정 다녀 보기로 했다. 그러다 모퉁이에 위치한 이집을 발견했다. 건물이며 실내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해 보이는 내공 있어 보이는 집이었다. 아무리 바닷가 도시라 해도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골 국물 요리집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우리의 예상이 들어 맞았다.


제법 연배가 있어 보이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전통 국물 식당이 그렇듯 남성 위주의 방문객에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다. 나도 사실 일 때문이 아니라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밥 때마다 반주삼아 술 한 잔 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다 나온 것 같은 손님들의 낮술은 영문을 모르겠다.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있을까?


단촐한 기본찬이 나왔다. 남도의 김치는 늘 젓갈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좀 뭐랄까 이질감이 있다고 할까 그런 감이 있어 마눌은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남도의 김치도 무척 좋아한다. 이집의 김치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갔지만 시원한 전형적인 남도 김치의 맛이었다. 그리 달지도 짜지도 않아 자꾸만 손이 갔다. 아직 본 메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면 아마도 우린 이 김치그릇을 다 비우고 더 달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는 갈비탕과 도가니탕을 주문했다. 갈비탕을 주문한 사람은 제대로 된 갈비라며 좋아했다. 갈비탕은 내가 알기론 대부분 직접 조리하기 보다는 공장의 갈비탕을 가져다가 그냥 끓여서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갈비를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곳에선 직접 갈비를 손질하여 넣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 갈비의 모습, 뼈와 잘 분리되면서 살이 튼실하게 붙어 있는 갈비였다.



나의 도가니 탕은 일단 국물을 먼저 맛 보았을 때 거의 짠맛이 없이 담백함 그 자체였다. 거기에 뽀얀 소고기 특유의 진한 국물의 모습이 있었다. 통풍있는 자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오늘만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도가니탕을 먹는다고 도가니가 튼튼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속은 편하지 않은가? 도가니탕의 뽀얀 국물을 보니 그렇게도 이 국물을 좋아하시던 장모님 생각이 났다. 이런 맛난 제대로 된 도가니탕을 한 번 더 대접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 아쉬움이었다.


도가니 탕도 갈비탕처럼 제대로 된 도가니들이 잔뜩 돌솥을 채우고 있었다. 요즘 이렇게 튼실한 도가니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런 이 먼 여수까지 와서 만나다니.... 이걸 먹고 싶음 어쩌란 말인가? 다시 여수로 와야 한다는 것인가? 도가니탕도 설렁탕처럼 일단 깍뚜기의 붉은 빛을 담아야 한다. 나는 늘 이렇게 깍뚜기나 김치국물을 넣어 뽀얀 국물을 벌겋게 물들여 먹곤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해야 소고기 국물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국물을 변신시키고 후추가루와 밥을 말아 드디어 시식의 순간이다. 도가니탕의 도가니는 사실 어릴적에는 줘도 안 먹던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이젠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었다. 왜 어릴적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감탄을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의 도가니 사랑도 이해가 될 것이다. 밤새 시달리던 내 속에 상처럼 준 이 점심의 뜨거운 국물로 다시 포천으로 올라갈 힘을 얻은 느낌이었다.


여수까지 와서 무슨 고기국물이냐고 하겠지만 과거 무역업을 할 때도 나는 외국 출장길에 유명하다는 맛집 보다는 현지인들이 자주 간다는 집을 일부러 찾아가 먹었었다. 사실 그 지역의 맛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현지인들이다. 그들이 자주 애용하는 집은 해당 지역의 맛을 대표하는 것이리라... 물론 오늘 우리가 간 집이 얼마나 여수에서 유명한 집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내공이라면 분명 오랜 세월 현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만족스런 점심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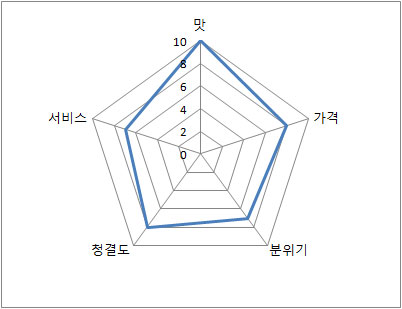
'맛있고 행복한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제나 반가운 음식, 생선초밥으로 먹는 점심, 포천시 일동면 스시로드 (0) | 2024.02.16 |
|---|---|
| 진정한 막국수의 강자, 메밀면과 양념장의 절묘한 조화가 좋다. 춘천시 샘밭막국수 (22) | 2024.02.16 |
| 특이하고 산뜻한 맛, 과연 이것은 냉면인가 막국수인가? 속초시 이조면옥 (0) | 2024.02.14 |
| 외할머니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익숙하고 친근하고 푸짐한 밥상, 포천시 내촌면 내고향 쌈밥 (0) | 2024.02.14 |
| 두툼하고 신선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회식, 양주시 고읍동 꽃돼지 솥뚜껑 삼겹살 (23) | 2024.02.14 |






